번역(翻訳): 방석구, 진행도: 6/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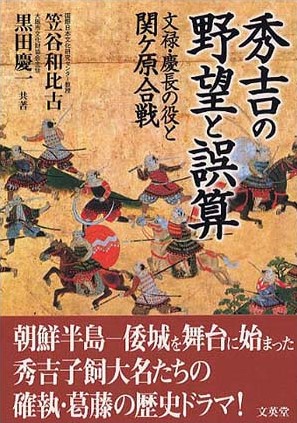
第千三十八夜【1038】2005年5月20日
제1038일째 밤【1038】2005년 5월20일
Seigow’s Book OS/TOUR
『秀吉の野望と誤算』
『히데요시(秀吉)의 야망과 계산착오』
笠谷和比古 ・ 黒田慶一
카사야 카즈히코(笠谷和比古) ・ 쿠로다 케이이치(黒田慶一)
2000年、文英堂
2000년, 분에이도(文英堂)
文=松岡正剛
글: 마츠오카 세이고(松岡正剛)
– 1 –
세키가하라 전투(関ヶ原の合戦) – 세키가하라 전투(関ヶ原の戦い) – 의 포진은 기묘했다. 동군(東軍)에서 이에야스(家康) – 도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 – 의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에야스(家康) 주위의 하타모토(旗本) 부대와 이이 나오마사(井伊直正) ・ 마츠다이라 타다요시(松平忠吉)의 2부대 및 이쿠사메스케(軍目付)인 혼다 타다카츠(本多忠勝) 정도로, 그 이외에는, 후쿠시마 마사노리(福島正則) ・ 토도 타카도라(藤堂高虎) ・ 하치스카 요시시게(蜂須賀至鎮) ・ 쿠로다 나가마사(黒田長政) ・ 이케다 테루마사(池田輝政) ・ 아사노 요시나가(浅野幸長) ・ 야마노우치 카즈토요(山内一豊) 등 하나같이 토요토미(豊臣)의 은혜를 입은 다이묘(大名)들 뿐이었다.
동군(東軍)과 서군(西軍) 그리고, 도쿠가와측(徳川)과 토요토미측(豊臣)은 실로 복잡한 연관관계를 이루고 있었다. 여기에는 지독하게 「왜곡된 구조」라고 할만한 것이 내포되어있다. 그것은 세키가하라 전투(関ヶ原の合戦)가 토요토미(豊臣)와 도쿠가와(徳川)의 전쟁이 아니라는 것이다. ① 저것은 토요토미 정권(豊臣政権) 시스템(System)이 안고 있던 정치사회의 모순 그 자체를 반영한 「결산(決算)」- 결과물 – 이었던 것이다.
주(註): ① 동군(東軍)과 서군(西軍)의 기묘한 포진을 말합니다.
애당초 「토요토미(豊臣)」란 무엇인가? 어째서 이런 이름이 되었던 것일까? 히데요시(秀吉)는 동시대에 「종1위(従一位)」와 「다이죠다이진(太政大臣)」그리고, 「칸파쿠(関白)」에도 올랐지만, 이것은 전부 조정(朝廷)으로부터 받은 관위(官位)의 승임이었다. 노부나가(信長) –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 – 도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루었다고 한다면 그뿐이겠지만, 하급부시(下級武士)였던 히데요시(秀吉)가 조정(朝廷)의 일을 주재하는 코카(公家) 최고위 관직에 오르기까지는 나름의 「② 시산(試算)」이 있었다. 독특한 시산(試算)이었다.
주(註): ②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게실 것 같아서 설명은 생략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시산(試算)에 의한 국가경영 시스템(System)은 조선침략(朝鮮侵略)과 동시에 어이없이 와해된다. 따라서 실제로는 이것들 모두가 비정상적이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야스(家康)에 있어서 세키가하라(関ヶ原)는 그 비정상적인 것을 걷어치우기 위한 「결산(決算)」의 장이었던 것이다.
주(註): 원문에는「朝鮮出兵(조선출병)」이라고 표기 되어있습니다만, 반크의 일본교과서 시정방안을 참조해 「조선침략(朝鮮侵略)」이라고 수정했습니다. “제목에서 ‘조선출병’을 ‘조선침략’으로 수정해야 한다. ‘출병’ 이란 용어는 조선이 잘못하여 일본이 이를 응징하기 위한 군사적 행위로 오해되기 쉬우므로, 일본의 일방적 군사적 침략이었음을 제목에서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 – 반크의 「조선출병」시정방안.
– 2 –
히데요시(秀吉)의 위상이 높아진 것은 혼노지(本能寺) – 혼노지의 변(本能寺の変) – 에서 노부나가(信長)가 쓰러진 후, 아케치 미츠히데(明智光秀)를 토벌했기 때문이었다. 그 직후 벌어진 키요스 회의(清洲会議)에서는 손자인 히데노부(秀信) – 오다 히데노부(織田秀信) – 가 후계자가 되고, 숙부인 오다 노부카츠(織田信雄) ・ 오다 노부타카(織田信孝) 형제가 후견인이 되었지만, 노부카츠(信雄)와 노부타카(信孝) 사이에 불화가 일어났다. 히데요시(秀吉)는 이 기회를 시바타 카츠이에(柴田勝家)와의 패권다툼으로 심화시켜 시즈가타케 전투(賤ヶ岳の戦い)에서 카츠이에(勝家)를 제거했다. 이로써 히데요시(秀吉)가 실질적인 오다 영국(織田領国)의 계승자가 되었다.
남은 것은 동쪽의 이에야스(家康)뿐이었으나, 코마키 나가쿠테 전투(小牧長久手の戦い)에서 어이없이 패하고 말았다. 이것을 계기로 히데요시(秀吉)는 시나리오(Scenario)의 수정을 가했다. 즉, 내전(内戦)을 통한 경쟁자 제거를 단념하고 조정관위(朝廷官位)와 텐노권위(天皇権威)에 의한 전국통일(全国統一)을 목표로 한 것이다.
시나리오(Scenario) 변경은 일사천리(一瀉千里)로 진행되었다. 코마키 전투(小牧の戦い) 직후인 텐쇼 12년(天正 12年, 1584年)에 종5위(従五位)에 서위(叙位)하고, 동월에 종4위하(従四位下) 산기(参議)에, 다음해 3월에는 정2위(正二位) 나이다이진(内大臣)이 되었다. 이어서 전 칸파쿠(関白)인 코노에 사키히사(近衛前久)의 양자 – 명목상의 아들 – 가 되어, 7월에는 정1위(正一位)에 승서(昇叙)하고, 칸파쿠(関白)의 칭호를 받았다.
그야말로 허위경력조작이라 해도 좋을 정도의 시나리오(Scenario)였지만, 그 대단원의 막이라고 할 화룡점정(画竜点睛)을 찍은 것이, 텐쇼 14년(天正 14年, 1586年)에 다이죠다이진(太政大臣)이 되어 「토요토미(豊臣)」성(姓)을 삼가 받았던 것이다.
이시기에 히데요시(秀吉)는 용의주도하게 이에야스(家康)를 상략(上洛)시켜, 자신에게 신종(臣従)하게 했다. 코마키 나가쿠테 전투(小牧長久手の戦い)에서 패했던 일이 꽤나 분했을 것이다. 히데요시(秀吉)는 「칸파쿠(関白)」라는 관직의 힘을 빌려 이에야스(家康)를 복종시켰던 것이다. 그것은 또 「토요토미(豊臣)」라는 새로운 「가문(家門)」으로의 복종을 시사했다.
주(註): 꼭 이렇지 만도 않지만, 원문을 그대로 번역합니다.
– 3 –
이렇게 해서 히데요시(秀吉)는 「소부지령(惣無事令)」을 선언한다. 전국각지의 영토분쟁(領土紛争)을 둘러싼 사사로운 전쟁을 금지하고, 그것에 반하는 자에게는 칸파쿠(関白) 다이죠다이진(太政大臣)이 군사적 제제를 가할 수 있는 정당성을 선언했다. 「日本六十余州ーの儀、改め進止すべきの旨、仰せ出さるるの条、残らず申付け候」로 되어 있다.
「신시(進止)」라는 것은, 텐노(天皇)의 의중이 담겨있는 「성려(聖慮)」에 일본(日本) 60여주(六十余州)의 전국통치권(全国統治権)이 위임되어있는 것을 말한다. 텐쇼 15년(天正 15年, 1587年)의 사츠마 시마즈 정벌(薩摩島津征伐) – 큐슈 정벌(九州征伐) -, 18년의 오다와라 정벌(小田原北条征伐)이 – 오다와라 정벌(小田原征伐) – 이 「신시(進止)」에 의해 실행되었다.
이즈음의 시나리오(Scenario)는 극에 달하고 있었을 것이다. 적어도 국내의 권력은 모두 손아귀에 있었다. 그러나, 히데요시(秀吉)의 야망은 일본(日本)에 멈추지 않았던 것이다.
– 4 –
히데요시(秀吉)가 중국(中国)과 조선(朝鮮)에 야망을 갖게 된 것은 노부나가(信長)의 영향이었다. 루이스 프로이스(Luis Frois)의 보고서에는 노부나가(信長)가 「일본 통일(日本統一) 후에 대함대(大艦隊)를 편성해 중국대륙(中国大陸)으로 공격해 들어간다」고 장담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노부나가(信長)의 아시아(Asia) 계획을 알고 있던 히데요시(秀吉)는 즉시 치쿠젠노카미(筑前守)에 취임승인을 신청한다. 치쿠젠(筑前)이 조선(朝鮮)에 가장 가까운 거점이었기 때문이었다.
노부나가(信長)도 히데요시(秀吉)도, 중국정책(中国政策)의 최초 동기는 명(明)과의 칸고 무역(勘合貿易)를 재개하고, 유리한 통상관계를 손에 넣는 것이었다. 그것이 국내통일을 서둘게 하고, 특히 시마즈(島津)를 토벌한 – 큐슈 정벌(九州征伐) – 즈음부터는 대륙확대정책(大陸拡大政策)으로 변질되고 있었다. 내전을 지속하기에는 이에야스(家康)가 벅찼던 까닭도 있었다.
히데요시(秀吉)는 「외부」로 향했던 것이다. 히데요시(秀吉)의 부교(奉行)들은 「③ 카라쿠니(唐国) ・ ④ 남만국(南蛮国)까지도 히데요시(秀吉)님에게 복종할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적고 있다. 히데요시(秀吉)가 명나라(明国)와 남만국(南蛮国)의 지배를 거론하기 시작한 것이다. 남만국(南蛮国)이란 루손(Luzon) ・ 마카오(Macao) ・ 고아(Goa) 등의 포루투칼령(Portugal領)과 에스파냐령(Espana領)을 가리킨다.
주(註): ③ 카라쿠니(唐国)는 중국(中国)이나 조선(朝鮮)을 가리킵니다. ④ 남만국(南蛮国)은 무로마치시대(室町時代)부터 에도시대(江戸時代)에 걸쳐, 샴(Siam) – 타이(Thailand) – ・ 루손(Luzon) – 필리핀(Philippines) – ・ 자바(Java) – 인도네시아(Indonesia) – 등 남방제지역(南方諸地域)의 총칭. 즉, 동남아시아(東南Asia)를 가리킨다. 또는 그 지역을 경유해 도래(渡来)를 위한 포루투칼인(Portugal人)이나 스페인인(Spain人) 등의 본국이나 식민지(植民地)를 말하기도 한다.
이리하여 히데요시(秀吉)는 결단을 내렸다. 조카인 칸파쿠(関白) 히데츠구(秀次)에게 제시한 25개조 슈인죠(朱印状) – 명령서(命令書) – 에는 일본(日本) ・ 조선(朝鮮) ・ 중국(中国)에 걸치는 터무니없는 「국가분할」계획이 제시되어 있었다. 틀림없는 팔굉일우(八紘一宇)였다.
고요제이텐노(後陽成天皇)를 중국(中国)의 베이징(北京)으로 옮기고, ⑤ 다이토 칸파쿠(大唐関白)에는 히데츠구(秀次)를 파견하는 한편, 일본(日本)의 제위(帝位)는 와카미야(若宮) – 나가히토신노(良仁親王) – 또는 하치죠미야(八条宮) – 토시히토신노(智仁親王) – 에게 계승케 하고, 그 칸파쿠(関白)직에는 하시바 히데야스(羽柴秀保) – 히데츠구(秀次)의 동생 – 혹은 우키타 히데이에(宇喜多秀家)를 지명했다. 조선(朝鮮)은 하시바 히데카츠(羽柴秀勝) –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의 4남으로 히데요시(秀吉)의 양자 – 나 우키타 히데이에(宇喜多秀家)에게 통치하게 하고, 큐슈(九州)를 코바야카와 히데아키(小早川秀秋)에게 맡겼다. 요컨대 중국황제(中国皇帝)를 일본인(日本人)으로 해, 국내의 텐노(天皇)와 구분한다는 것이었다.
주(註): ⑤ 다이토 칸파쿠(大唐関白)는 중국(中国)에 두려고 한 칸파쿠(関白)입니다.
하지만 조선(朝鮮)에는 칸파쿠(関白)직을 배당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히데요시(秀吉)의 머리 속에는 조선(朝鮮)은 “국내(国内)”였기 때문이었다. 실제로도 츠시마(対馬)의 소시(宗氏)에게는 「조선국왕(朝鮮国王)을 일본(日本)의 ⑥ 다이리(内裏)에 출사시켜라」라고 명했던 것이었다.
주(註): ⑥ 다이리(内裏)는 텐노(天皇)가 주거하는 궁전(宮殿)을 말합니다.
– 5 –
히데요시(秀吉)가 조선(朝鮮)을 “국내(国内)”라고 간주한 것은 그만의 독자적인 발상은 아니었다. 이미 텐분 9년(天文 9年, 1540年)에 오우치 요시타카(大内義隆) – 센고쿠 다이묘(戦国大名) – 가 보낸 켄민시(遣明使)가 베이징(北京)에 당도했을 때, 「결국 일본(日本)은 조선(朝鮮)을 복속시킬 것이므로, 좌석의 순위는 조선(朝鮮)의 상위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의했다.
오우치(大内)는 영국(領国)내의 이와미 은광(石見銀山)를 배경으로한 실버러쉬(Silver Rush)를 무기로 조선(朝鮮)에 대해서는 언제나 강경했다. 서국(西国)의 일개 다이묘(大名)가 이러한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천하를 통일한 히데요시(秀吉)의 입장에서 조선(朝鮮)을 복속시키는 것은 이미 대전제가 되어있었다. 이미 에스파냐(Espana)가 마야제국(Maya帝国)이나 잉카제국(Inca帝国)을 수중에 넣고, 포루투칼(Portugal)이 아프리카(Africa)에서 노예무역(奴隷貿易)을 하는 것도 알고 있었다. 히데요시(秀吉)는 당시 구라파(欧羅派) 열강의 정복욕에 사로잡혀있었던 것이다.
주(註): 『역사고찰(こだわり歴史考) – 일명무역(日明貿易)과 이와미은(石見銀)을 독점(独占)』- 요미우리 신문(読売新聞) 큐슈발(九州発) – 에 의하면, 오우치씨(大内氏)는 조선(朝鮮)으로부터 하이후키법(灰吹き法) – 정련기술(精錬技術) – 을 습득해 은광(銀山) 개발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당시 조선왕조(朝鮮王朝) – 이성계(李成桂)에 의해 1392년 건국(建国) – 는 「⑦ 경무숭문(軽武崇文)」의 풍조가 있었다. 즉, 문관(文官)이 무관(武官)의 우위에 있었던 것이다. 귀족(貴族)과 사족(士族)계급은 양반(両班)이라고 일컬었고, ⑧ 문반(文班)과 무반(武班)의 양쪽을 좌지우지했지만, 의정부(議政府)라는 어전회의(御前会議)처럼 최상부 재정기관(裁定機関)에서는 군무대신(軍務大臣)이 맡았던 병조판서(兵曹判書)는 문관(文官)이 군림하고 있었다. 그런 까닭으로 군대(軍隊)도 이를 테면 자위대(自衛隊)와 같이, 완전한 시빌리언 컨트롤(Civilian Control)에 근원을 두고 있었다.
주(註): ⑦ 경무숭문(軽武崇文): 무를 경시하고 문을 숭상함. ⑧ 문반(文班)은 동반(東班) 무반(武班)은 서반(西班)이라고 합니다.
– 6 –
좀더 당시의 조선왕조(朝鮮王朝)의 상황을 이야기하자면, 국정상은 명(明)의 황제(皇帝)로부터 조선(朝鮮)의 국왕(国王)임을 인정하는 「책봉(冊封)」- 봉작(封爵) – 을 받았다. 즉 종주국(宗主国) – 명(明) – 과 번속국(藩属国) – 조선(朝鮮) – 의 관계에 있었다.
이것은 지배(支配)와 피지배(被支配)라는 도식적 관계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식민지(植民地)라는 것도 아니다. 관례(慣例)인 책봉(冊封)과 조공(朝貢)의 의식만을 행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중국(中国)도 조선(朝鮮)의 정치에 관여하지 않았다. 이것이 종속관계(宗属関係)라는 것이었다. – 원래 중국(中国)에는 이러한 성향이 있었다. 조공(朝貢)의 예를 갖추기만 한다면, 특별히 문제삼지 않았다. –
일본(日本)도 형식적으로는 중국(中国)과 조공관계(朝貢関係)를 맺고 있었다. 아시카가 요시미츠(足利義満) – 무로마치 바쿠후(室町幕府) 3대 쇼군(将軍) – 가 왜구(倭寇)를 금압해 명(明)의 책봉(冊封)을 받아 「일본(日本)의 국왕(国王)」임을 자칭한 일이 있었다. 덧붙여 말하면 중국(中国) 주변국이 중국(中国) 황제(皇帝)에 조공(朝貢)하는 관계를 「사대(事大)」, 그러한 주변 국왕(国王)간의 교류를 「교린(交隣)」이라 하는데, 일본(日本)과 조선왕조(朝鮮王朝)는 그 교린관계(交隣関係)에 있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조선왕조(朝鮮王朝)는 전란이 없는 평화국가였던 것이다. 그런 만큼 내정에서는 당파당략(党派党略)의 정쟁에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당시는 동인당(東人党)과 서인당(西人党)의 맹렬한 주도권 다툼이 있어, 일본(日本)에서 파견된 조선통신사(朝鮮通信使)도 ⑨ 세이시(正使)와 후쿠시(副使)에 양파(両派)가 섞여있었다. 동인(東人)과 서인(西人)이란 것은 수도인 한성(漢城)의 동서(東西)를 지칭하는 것이었지만, 거기에는 유교정치(儒教政治)의 해석을 둘러싼 대립이 반영되어있었다. 동인당(東人党)의 이퇴계(李退渓) – 이황(李滉) – 는 주리설(主理説), 서인당(西人党)의 이율곡(李栗谷) – 이이(李珥) – 은 주기설(主気説)을 주장했다.
주(註): ⑨ 세이시(正使)는 중심이 되는 사자(使者)를 후쿠시(副使)는 세이시(正使)를 보조하는 사자(使者)를 말합니다.
이러한 조선(朝鮮)의 정세를 간파해, 큐슈 평정(九州平定) – 큐슈 정벌(九州征伐) – 을 끝마친 히데요시(秀吉)가 대륙제패(大陸制覇)의 야망을 채우려고 했던 것이다. 국내통일에 여념이 없던 노부나가(信長)가 손쓰지 못한 외교에, 히데요시(秀吉)가 처음으로 착수했다고 할 수 있다.
おしまい
PS: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임진왜란의 시작이 되지만, 개인적으로는 관심분야 밖이라서 여기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어 설명
– 혼노지의 변(本能寺の変) ほんのうじ-のへん
텐쇼 10년(天正 10年, 1582年), 모리씨(毛利氏)와 대전 중이던 하시바 히데요시(羽柴秀吉) – 토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 – 의 지원을 위해 아즈치(安土)를 출발해 쿄토(京都)의 혼노지(本能寺)에 머물고 있던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가, 역시 츄고쿠(中国) 공략을 위해 탄바(丹波)의 카메야마성(亀山城)으로부터 선발대로 출발한 아케치 미츠히데(明智光秀)에게 습격을 받아 자결한 사건.– 시즈가타케 전투(賤ヶ岳の戦い) しずがたけ-のたたかい
텐쇼 11년(天正 11年, 1583年) 4월, 시즈가타케(賤ヶ岳) 부근에서 하시바 히데요시(羽柴秀吉)가 시바타 카츠이에(柴田勝家)를 토벌한 전쟁. 혼노지의 변(本能寺の変) 이후,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의 차남인 오다 노부카츠(織田信雄)를 지지한 히데요시(秀吉)와 삼남인 오다 노부타카(織田信孝)를 지지한 카츠이에(勝家)와의 대립이 원인이었다. 카츠이에(勝家)와 노부타카(信孝)는 자결해, 히데요시(秀吉)의 전국제패(全国制覇)를 위한 기초가 마련되었다.– 코마키 나가쿠테 전투(小牧長久手の戦い) こまき-ながくてのたたかい
텐쇼 12년(天正 12年, 1584年), 오와리(尾張) 코마키(小牧) ・ 나가쿠테(小牧)에서 벌어진 토요토미 히데요시군(豊臣秀吉軍)과 도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 ・ 오다 노부카츠(織田信雄) 연합군(連合軍)과의 전쟁. 승패가 결정 나지 않아, 장기전이 되었기 때문에 강화를 맺어서 종결되었다.– 세키가하라 전투(関ヶ原の戦い) せきがはら-のたたかい
케이쵸 5년(慶長 5年, 1600年) 9월 15일, 세키가하라(関ヶ原)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를 주축으로 하는 동군(東軍)이 이시다 미츠나리(石田三成) 등의 서군(西軍)을 무찌른 전쟁. 토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 사후, 천하의 실권을 장악한 이에야스(家康)에 대립한 미츠나리(三成)는 여러 제대명(諸大名)을 규합해 전쟁을 벌였지만, 코바야카와 히데아키(小早川秀秋)의 배반에 의해서 서군(西軍)은 참패해, 미츠나리(三成) 등은 처형되고, 토요토미 히데요리(豊臣秀頼)는 셋츠(摂津) ・ 카와치(河内) ・ 이즈미(和泉) 60만(万) 코쿠(石)의 일개 다이묘(大名)로 전락했다. 그 결과, 도쿠가와씨(徳川氏)의 패권이 확립되었다. 흔히 「천하(天下)를 판가름하는 전쟁」이라고 한다.– 소부지령(惣無事令) そうぶじれい
토요토미 정권(豊臣政権)에서 실행되었던 법령으로 다이묘(大名)간의 사사로운 분쟁을 금지시켰다.– 큐슈 정벌(九州征伐) きゅうしゅう-せいばつ
텐쇼 15년(天正 15年, 1587年), 토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가 사츠마(薩摩)의 시마즈씨(島津氏)를 정복해, 큐슈 전토(九州全土)를 지배하에 두었던 전쟁.– 오다와라 정벌(小田原征伐) おだわら-せいばつ
텐쇼 18년(天正 18年, 1590年), 토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가 오다와라성(小田原城)에서 호죠 우지마사(北条氏政) ・ 우지나오(氏直) 부자를 공격해 멸망시킨 전쟁. 이것에 의해 히데요시(秀吉)의 전국제패(全国制覇)가 완성되었다.– 치쿠젠(筑前) ちくぜん
옛 지명. 후쿠오카현(福岡県)의 북부 서부에 해당한다.– 슈인죠(朱印状) しゅいんじょう
센고쿠 다이묘(戦国大名)나 에도시대(江戸時代)의 쇼군(将軍)이 수결대신 슈인(朱印)을 찍어 발행한 공적 문서(公的文書).– 팔굉일우(八紘一宇) はっこう-いちう
니혼쇼키(日本書紀)의 「掩二八紘一而為レ宇」에서 따온 말로써, 천하를 한집처럼 여긴다는 것. 즉, 천하가 모두 텐노(天皇)의 집이라는 사상. 제2차 대전(第二次大戦) 중, 대동아 공영권(大東亜共栄圏)의 건설을 의미해, 일본(日本)의 해외침략(海外侵略)을 정당화하는 슬로건(slogan)으로 사용되었다.– 대동아 공영권(大東亜共栄圏) だいとうあ-きょうえいけん
제2차 대전(第二次大戦) 중, 특히 쇼와 15년(昭和 15年, 1940年) 경부터 일본(日本)이 주창한 슬로건(slogan). 구미(欧米)의 식민지지배(植民地支配)에 대항해서 아시아(Asia) 지역에 공존공영(共存共栄)의 신질서(新秩序)를 수립하자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일본(日本)의 침략정책(侵略政策)을 정당화하려고 했던 것.– 켄민시(遣明使) けんみんし
무로마치 바쿠후(室町幕府)부터 명나라(明国)에 파견한 사절(使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