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하라 누벨바그: 여전히 새로운 물결-장뤼크 고다르(JEAN-LUC GODARD), 혹은 새로운 영화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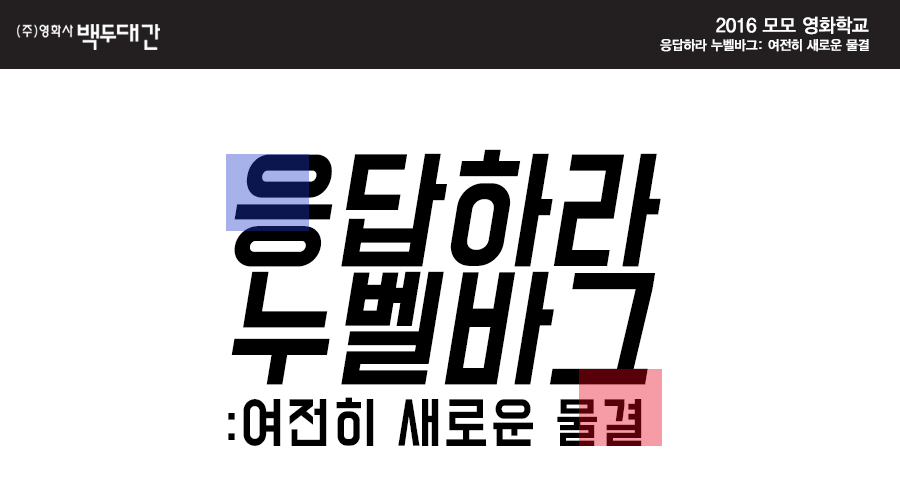
일시: 2016년 4월 14일(목) 저녁 8시
강사: 정성일 영화감독/평론가
장소: 이화여대 ECC 내 강의실
정리글: 나

ㅇ장뤼크 고다르(Jean-Luc Godard)의 생애
프랑수아 트뤼포(François Truffaut)가 프롤레타리아(Proletariat)였던 반면, 고다르는 부르주아지(Bourgeoisie)였지만 권위주의적인 아버지와 냉소적인 가족관계로 인해 불우했고, 이러한 영향이 고다르와 트뤼포를 가깝게 했다. 고다르는 수학, 만화에 재능을 보였으며 다독가였다. 그가 매료되었던 작가는 제임스 조이스(James Joyce) 와 지그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였다. 고다르는 그가 몸담았던 카이에 뒤 시네마(Cahiers du cinéma)의 금고에 손을 대는 등 평생 도벽을 버리지 못하기도 했다.
또한, 카이에의 동료들이 시네마테크 프랑세즈(Cinémathèque Française)의 영화에 열광했다면, 고다르는 영화를 주제에 따라 편성하는 방법에 관심을 갖았고, 그리스 시대의 희곡이 했던 역할을 20세기 프랑스 영화가 대체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동료들과의 첫 번째 차이점은 그들이 파리에 거주했다면, 그는 외부에서 들어온 이방인 같았으며 그렇게 보이려 노력했다. 두 번째 차이점은 그들은 비평가를 거쳐 감독이 되었던 반면, 그는 비평가를 거치지 않았고, 고다르는 비평가가 비평으로 영화를 만든 다면, 감독은 길바닥에서 영화를 만든다고 생각했으며 이것은 서로 간의 차이가 없음을 나타낸다.
비평의 관점에서 동료들이 영화를 찍고 비평가들에게 평을 받았다면, 고다르는 영화 자체로부터 거리를 두고 스스로가 자신의 영화를 비평했다. 왕가위 감독이 이러한 경향을 이어받았는데, 영화를 촬영하고 편집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새로운 영화를 만들었다. 그의 영화에 등장하는 나레이션은 이러한 편집의 불협을 보완하는 연결점이다. 길바닥의 관점에서는 길거리에서 영화를 찍는 자체가 네오레알리스모(Neorealismo)라고 생각했다.
카이에의 동료들이 앙드레 바쟁(André Bazin)을 존경했다면, 그는 존중했으며, 프랑수아 트뤼포(François Truffaut)가 선호도에 따라 영화를 선택했다면, 그는 막스 오퓔스(Max Ophüls)부터 장 주네(Jean Genet)까지 모든 스펙트럼을 섭렵했다. 앙드레 말로(André Malraux)의 ‘벽 없는 미술관’에서 미술관은 인간의 개념적 공간을 지칭하므로 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물리적 공간을 변화시킨다. 고다르는 여기에 주목했다. 그렇다면 영화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ㅇ장뤼크 고다르(Jean-Luc Godard)의 정치와 영화의 관계
그가 카이에의 창단 일원으로 참여했을 때, 바쟁은 영화를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에 반대했다. 고다르는 네오레알리스모(Neorealismo)의 영화를 정치가 아니라 하나의 형식이라고 판단했다. 그것은 영화의 주제가 주는 정치적 영향 보다는 영화 자체가 정치의 일부분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영화는 리얼리티의 재현이 아니라,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으로 영화 자체에서 정치적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닌, 정반합의 논리로 정치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다. 로베르토 로셀리니(Roberto Rossellini)의 독일 영년(Germany, Year Zero)으로부터 이러한 영향을 받았다. 카이에의 일원 모두 로셀리니에 영향을 받았지만, 그 영화들은 모두 달랐다.

ㅇ장뤼크 고다르(Jean-Luc Godard)의 작가주의
실존주의(Existentialism)는 실존이 본질에 선행한다는 것. 즉, ‘내가 있다’는 전제로부터 출발하여 ‘나’를 세계와 연결지음으로써 그 전제를 확인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데카르트가 말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논리는 역전된다. 어떻게 하면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먼저 파악할 수 있는가가 목적 추구가 된다. 이것은 구조주의(Structuralism), 작가주의와 일맥상통한다. 작가주의의 핵심은 주제나 소재가 아니라 카메라의 촬영과 미장센(Mise-en-scène), 배우의 동선, 연출. 즉, 영화 메커니즘(Mechanism)의 이해를 통해서만 영화를 재현 할 수 있으며, 어떻게 관객을 영화에 동참 시킬 수 있을까 생각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카이에는 꽃을 피웠지만 바쟁은 이러한 태도가 관념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윌리엄 와일러(William Wyler), 오손 웰스(Orson Welles)의 딮 포커스(Deep focus)를 바쟁은 민주적이라고 표현했다. 사물과 배경을 1:1로 매칭하여 관객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었다는 얘기다. 고다르는 ‘나의 아름다운 근심’에서 그것을 인정하면서도 프레임을 잡는 것 자체가 편집이라고 편집의 범위를 확장시켜 생각했다. 또한 카메라가 리얼리티다. 카메라와 대상이 존재할 경우, 고전은 모더니즘을 감추었고, 모던 시네마는 감춰왔던 부분을 공개했을 뿐, 영화는 근본적으로 모더니즘이었다라고 했다.
고다르는 다른 동료와는 달리 다큐멘터리로 영화를 시작했으며, 그들이 자신의 시나리오로 영화를 찍었던 반면, 그는 타인의 시나리오를 비판하는 것처럼 영화를 찎었다. 더불어 인물보다는 인물 주변을 묘사함으로써 인물을 입체적으로 만들었다. 이러한 고다르의 태도는 내용이 아니라 형식이 곧 내용이라는 것과 같다. 영화는 사건을 찍는 것이 아니라 관객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ㅇ마무리
장뤼크 고다르는 이 세상의 천재들이 그러하듯 결핍되어 있었으며, 새로운 것을 위한 갈망, 기존의 틀로부터의 벗어남을 평생 추구했던 것 같다.
– 장뤼크 고다르(Jean-Luc Godard)를 통한 영화 역사를 보는 관점
- 장뤼크 고다르(Jean-Luc Godard) 이전과 이후로 나뉘는 관점
- 누벨 바그(Nouvelle Vague)와 모던 시네마(Modern Cinema) 감독 중 한 명으로 보는 관점
– 장뤼크 고다르(Jean-Luc Godard)의 특징
- 에릭 로메르(Éric Rohmer), 프랑수아 트뤼포(François Truffaut), 클로드 샤브롤(Claude Chabrol)은 일관성 유지
- 장뤼크 고다르(Jean-Luc Godard)는 새로움을 추구, 지속적인 스타일의 변화
– 장뤼크 고다르(Jean-Luc Godard)의 영화 분류 방식
- 68 혁명(Mai 68) 전후
- 배우자였던 안나 카리나(Anna Karina), 안느 비아젬스키(Anne Wiazemsky)와의 만남
사족
예전에 작성한 글인데 날아갔다가 귀차니즘을 극복하고 복구했다. 나머지는 Evernote에 있으나 별다른 건 없어서 생략.